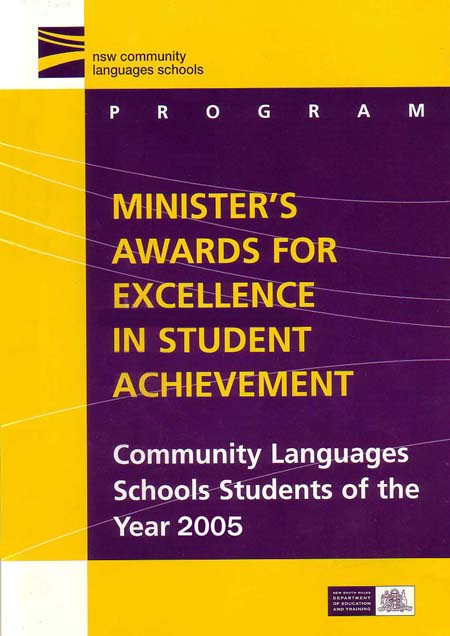한글 이름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김미리 학부모
“엄마~~빨리 일어나~ 한국학교 가야지~”
매주 토요일 아침. 클로이가 우리 부부를 깨우는 소리이다.
아~ 나도 주말엔 늦잠 좀 더 자고 싶은데… 좀 더 뒹굴뒹굴 침대에서 느긋하게 자고 싶은데… 이런 맘이 굴뚝같은데 클로이는 우리 가족의 달콤한 토요일 아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 맹모삼천지교라고 그 유명한 맹자의 어머니께서도 자식의 교육을 위해 그리 이사를 다니셨다는데, 뭐 1~2시간 늦잠이 대수랴… 부랴부랴 일어나서, 아직 잠에서 덜깬 둘째를 차에 태우고 한국학교를 향한 지도 거의 2년.
‘클로이 남’이란 이름에서 알다시피 우리 부부는 클로이에게 한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그만큼 굳이 호주에 살면서 한글 이름이 필요하지 않을 거고 중요하지도 않을거란 생각에 한글 이름은 처음부터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점차 클로이가 커가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문득 ‘우리 부부가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면 과연 클로이가 자라면서 우리와 어느 정도의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의 화목과 평화를 위한 대화의 깊이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에 한국학교의 문을 두드렸다.
처음 학교에 간 날. 아이가 이름을 쓸 수 있느냐는 교장 선생님의 말에 ‘우리 클로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처음부터 재미있게 하나하나 배우려고 왔어요’라는 마음으로 학교를 보내기 시작했다.
아이를 위해 우리 부부가 해주는 유일한 도움은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를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확인해 주는 게 다일 뿐인데도 클로이의 한글 실력은 나날이 발전되어서 어느덧 우리랑 나란히 책을 같이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더 이상 긴~ 내용의 책들을 소리 내서 읽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너무 좋은점 같았다. 그동안 좋은 엄마 아빠 노릇 한다고 열심히 책을 읽어준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또한 클로이가 간혹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가족이라곤 우리 밖에 없는 이 나라에서 형제끼리 저리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면서 행복이란 우리 삶에 이리 가까운 곳에 있구나라는 기분에 뿌듯해지는 순간도 생긴다.
종종 주위에 클로이의 예의 바름과 똑똑함을 칭찬하시는 몇몇 분들을 보면, ‘정말 이건 우리가 가르친 게 아닌데… 왜 이리 착하지?’라는 생각과 함께 이게 모두 한국학교에서의 배움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다.
어른들께 인사 잘하는 것과 높임말을 써야 한다는 거… 서로 도와주며 예의범절을 지키는 이러한 한국 문화적인 행동은 2년이라는 세월 동안 클로이의 몸과 마음에 서서히 스며드는 가랑비가 되어 지금의 클로이의 모습이 완성되어진 것 같다는 생각 말이다.
한국인 부모들이여~ 더 이상 애들 한글 가르친다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지 말고 모든 체계를 갖춘 전문 한국학교로 보내는 건 어떠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