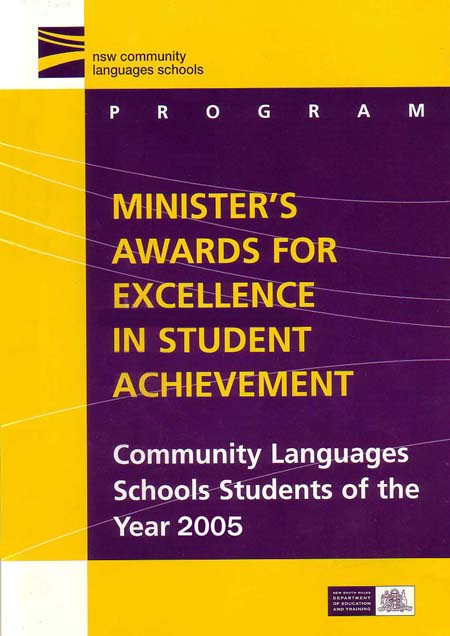<학부모 초대석>
영어 먼저 ? 한국어 먼저 ?
강소영 학부모
언어는 힘이다.
각 나라의 문화, 정체성 더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모든 과정에 언어만큼 중요하고 강력한 도구는 없다. 호주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 아이들과는 다르게, 잠깐의 유년시절을 거쳐 호주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언어는 늘 즐거움인 동시에, 어려움 그리고 도전의 대상이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그리고 영어를 외국어로 배운 나에게 한국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영어는 조금의 용기를 필요로 하는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알고 크겠지,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으면 정말 좋을텐데…. 그렇게 큰 아이가 4살 즈음,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한 한국어 교육. 혹자는 한글학교 보내 뭐하냐고 했다. 영어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며, 그래야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며, 엄마 아빠의 영어능력을 의심하며 아이들을 집에서 영어로 교육할 수 없다면 영어교육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 부모가 된다는 것, 어느 하나 쉬운 결정이 없는 어려움의 연속이지….’ 나는 나의 생각과 철학을 믿기로 했다. 결심 후, 나는 시드니에서 가장 크고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어 아이들이 한글을 바르게 그리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한글학교를 찾기 시작했다. 어렵지 않게 모두가 입을 모아 공통으로 추천한 ‘호주한국학교’. 나는 단 한번도 나의 선택을 후회한 적 없다.
5%. 얼마 전 한국여행을 하던 중 아들은 대뜸 나에게 말했다. “엄마 5%밖에 못 알아듣겠어” “뭘?” “저 사람들이 하는 말 말이야. 한국말이야? 난 5%밖에 안 들려” 나는 배가 아프도록 웃어 제꼈다. 나의 신랑의 고향은 대구. 경상도 특유의 강하고 거친 음성이 아이에겐 외계어처럼 들린 것이다. 한국여행을 하기 전부터 사투리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던 아이는 직접 겪은 대구 서문시장의 사투리를 단 5% 흡수한 것이다. 서울에서 태어난 엄마와 대구에서 태어난 아빠 사이,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표준어 그리고 사투리를 제법 구별할 줄 알지만 현장감 넘치는 사투리에 아이가 던진 숫자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달까. 그러던 중 서울로 올라가 여행을 하며, 아이는 나에게 슬며시 다가와 귓속말을 전했다 “엄마 지금은 90%야”. 같이 살고 있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 그리고 한글학교에서 접하는 표준어. 아이에게 사투리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지만 늘 즐겁게 공부한 한글 덕분에 한국 여행이 더욱 풍부해졌을 것이다.
한달 간의 여행, 아이들은 반짝거리는 눈으로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엄마 아빠의 나라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나라. 온몸으로 느끼고 마주한 한국이 아이들은 더없이 신기하고 즐거웠으리라. 아이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시던 시부모님은 괜한 기우였다며 지내는 내내 너무나도 행복해하셨다. 매주 수고해 주시는 교장 선생님과 한국학교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시고는, 더없이 뿌듯하다 하셨다. 자신의 뿌리를 알고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며느리 에게도 장하다며 엄청난 용기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이들은 더할 수 없이 가까워졌고 더욱 깊어졌다. 언어가 가진 강력한 힘일 것이다.
한국어를 너무나도 유창하게 구사하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문제없이 두 언어를 구사한다. 한글로 다진 언어실력이 영어습득과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모든 감사함을 호주한국학교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께 전하고 싶다. 타국에서의 모국어 교육.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으며, 막대한 사명감으로 임하시는 마음에 무한한 응원과 지지를 드리고 싶다. 지금도 ‘고향의 봄’을 부르며 ‘에버랜드’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글을 마무리짓는다. 한글 교육을 고민하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이 마음이 다가가 닿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