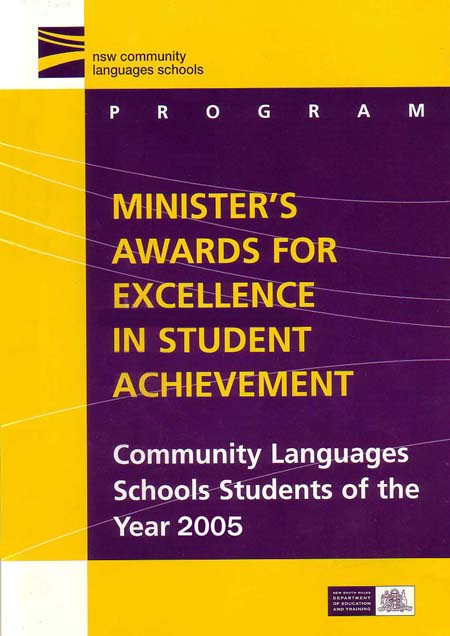“그럼 아빠도 똥강아지야~~~”
김진규 학부모
매일 아침 내가 바라는 행복한 일상 중에 하나는 이른 아침 새근새근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만져주고 멀찌감치 걷어진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여느 주말의 고요한 아침에 커피 한 잔의 사치와, 아이들이 일어나서 부스스한 얼굴로 ‘아빠~~~’ 하고 나를 부르는 소리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곤 아이들의 부름에 ‘아이구, 우리 똥강아지들~ 잘 잤어?’라고 아침 인사를 하고 잠은 잘 잤는지, 간밤에 무서운 꿈을 꾸지는 않았는지 얘기를 한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는 그간의 피로를 확~ 풀어주는 신기한 마법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8월 한 달 동안은 조금이나마 삶의 여유를 만끽했다.
3개국어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게 그저 고맙고 미안할 뿐이다. 아마도 아내의 헌신적인 보살핌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간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었다. 매주 주말 나의 토요일은 이런 내가 바라는 행복한 일상이 아닌 그저 평일의 연장이었다.
뭐…. 시간이 있더라도 일에 치여 사는 생활에 난 가끔 아이들과 놀아주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같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던 8월의 어느 날 오후….
둘째가 내 옆으로 태블릿을 들고 와선 콩순이를 보고 있다.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보고 있어서 갑자기 궁금해졌다.
과연 잘 이해를 하면서 보는 건지…. 아니면 걍 보는 건지…. 그래서 물어봤다.
“선아는 콩순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요?”
“응~ 선아는 다 알아~” 그런다….
기특하다. 아직 한국말이 많이 서툴지만, 기죽지도 않고 자기가 아는 단어와 표현을 이리저리 마구 섞어 말한다. 그러다 갑자기 난 멍해진다… 한국말인 건 분명한데… 대체 알 수가 없다. 짧은 적막이 흐르고 둘째에게 말한다.
“엉? 다시 한 번 아빠한테 말해 줄래요? 아빠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음….”
잠시 동안의 인고의 시간을 갖게 나는 기다려 준다. 그리고 나도 인내의 시간을 갖는다. 그렇게 몇 번을 되풀이한 끝에 의미를 알아냈다. ‘~~~~~~~~~~~~~~~’
그런 과정에서의 둘째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
“아유~ 이 귀여운 똥강아지야.”
“엉? 아빠, 똥강아지가 뭐야?”
“강아지의 새끼인데…. 새끼 때 재롱부리는 게 너무 귀엽거든…. 귀엽다는 의미예요~~ 선아도 보면 아주 귀여워서 좋아할꺼야~”
했더니…. 둘째의 다음 말이 아주 신선(?)했다.
“그럼 아빠도 똥강아지야~~~” 하며 씨~익 웃는다.
웅….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아빠인 나도 똥강아지가 될 수가 있는 거구나…. 아이의 말에 나는 피식 웃음이 났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도….
그렇게 어느 오후의 시간은 훌쩍 가버렸다.
TV 앞에서 한국말로 된 게임에 열중하던 첫째는 배 고프다며 신호를 보내고 아내는 저녁 준비를 시작한다. 그리고 나도 빨래 정리를 하러 일어나면서 아이들한테 말했다.
“종호, 선아, 오늘 저녁 먹고 아빠랑 같이 한국말 공부하자~~ ”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는 첫째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아마도 못 들은 척하는 거 같다. 선아는 의외로 씩씩하게 대답한다.
“네에~~~~”